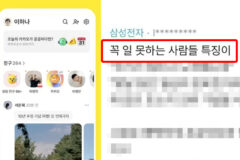“법으로 금지” 영화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간 절대 안 푼다는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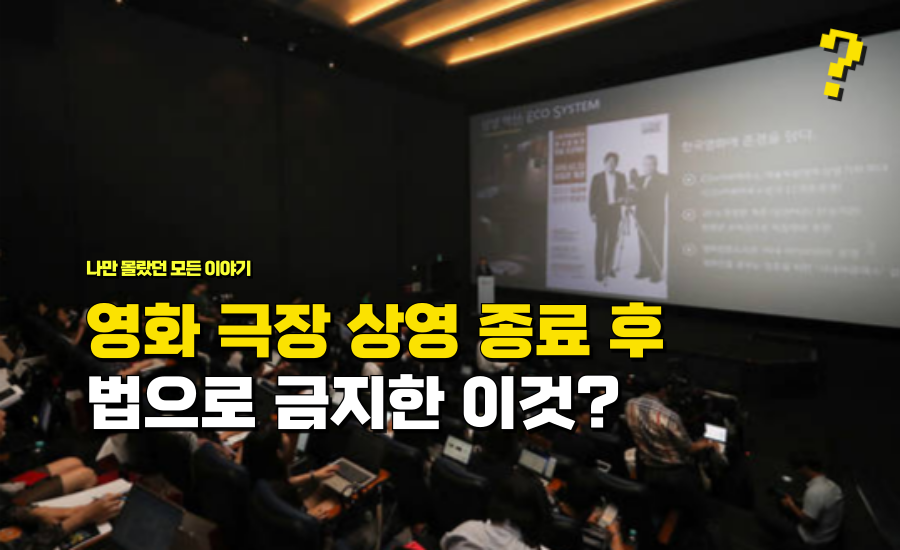
“법으로 금지” 영화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간 절대 안 푼다는 ‘이것’
국회가 추진하는 ‘홀드백 6개월 법안’
최근 국회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동안 온라인 공개를 금지하는 이른바 ‘홀드백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화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영화가 극장 상영을 마친 뒤 최소 6개월은 OTT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국내 최초로 극장과 OTT 간 홀드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찬반 갈린 업계 반응
법안의 목적은 극장 보호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반대 측은 단순히 OTT 공개를 늦춘다고 해서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오리란 보장은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시기보다 콘텐츠”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반면 찬성 측은 붕괴된 영화산업 유통구조를 복원하려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홀드백’이란 무엇인가?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뒤 IPTV·OTT·케이블 등 다른 유통 창구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원래는 약 10주로 설정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4주 이내로 짧아졌다. 글로벌 OTT의 확산이 이를 더욱 앞당겼다. 본래는 작품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의 개념이었지만, 이번 법안은 그 전략을 아예 법으로 고정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의 비판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라고 강조했다. 유진희 중앙대 교수 역시 “흥행하지 못한 작품까지 6개월 묶어두면 오히려 OTT 수익 기회까지 잃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업계 배급사 관계자들도 “개별 영업활동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다.

극장의 반격 논리
반대로 극장 업계는 “홀드백 정상화 없이는 산업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이후 박스오피스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20% 줄었지만, 같은 기간 넷플릭스 한국 가입자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극장은 관객 수에 비례해 수익이 늘지만 OTT는 제작사 중심 수익 구조라 배급·투자사가 피해를 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부각된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해외에서도 홀드백 논쟁은 치열하다. 미국·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일정 기간 극장 독점 상영을 보장한다. 반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는 동시 개봉 또는 개봉 직후 공개를 확대하며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다. 한국의 이번 법안은 후자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핵심 정리
- 국회, 영화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간 OTT 공개 금지 법안 발의
- OTT 공개 지연이 관객 회복으로 이어질지 실효성 논란
- 전문가들 “좋은 영화는 법과 무관하게 관객을 끌어온다” 비판
- 극장 업계는 “산업 생태계 복원 위한 최소한의 규제” 주장
- 해외도 극장 독점과 OTT 확산 사이에서 갈등 지속, 한국도 선택 기로에 놓임